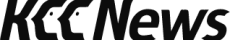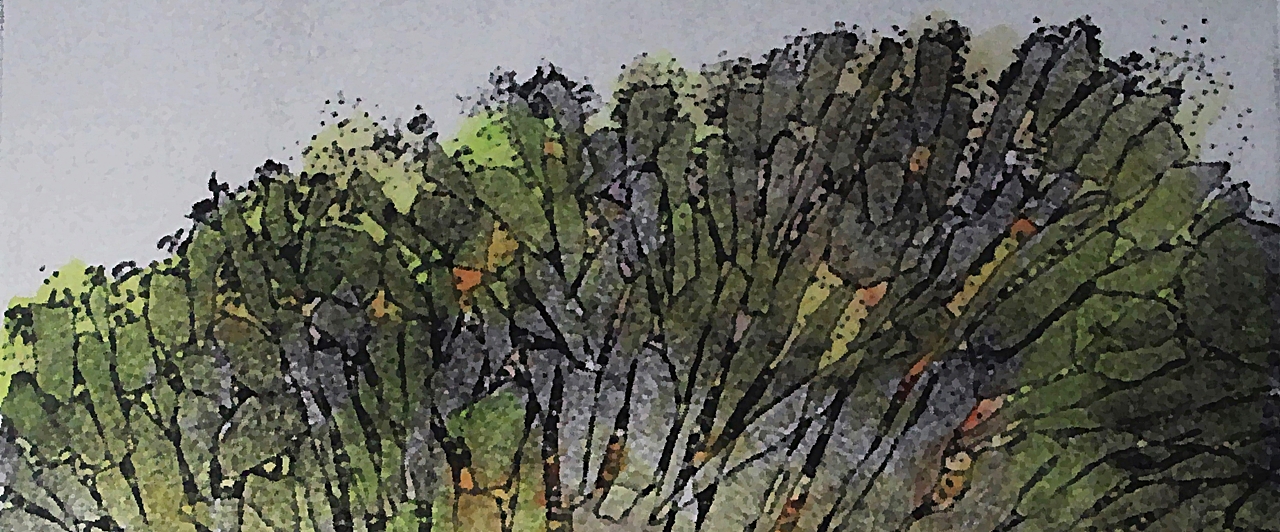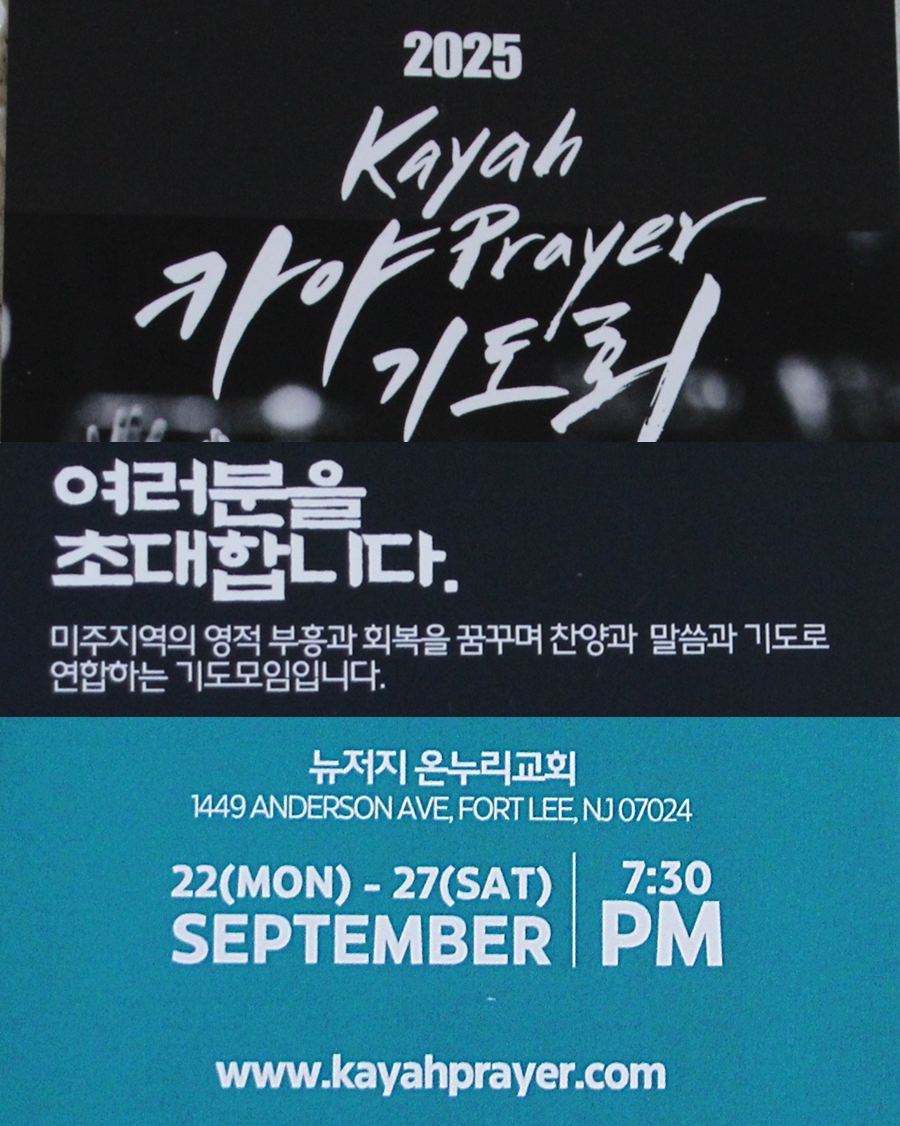요즘 우리 부부는 서로를 소 닭 보듯 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을 세 마디 이상 하면 면박을 당하거나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입을 다물고, 바깥 약속은 달력 날짜 밑에 꼬박꼬박 적어 이식(二食)이인지 삼식(三食)이인지를 알려 주고, 딴방을 쓴 지 오래됐지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방문만 살짝 열어 묵언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 닭 보듯 하다’라는 속담은 아무 관심이 없이 본 둥 만 둥 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덩치나 식성이 달라 다툴 일이 없고, 피차 아무 영향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존재여서 무심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골집 마당에서 닭이 누워 있는 소 옆에서 부지런히 쪼아대도 소는 닭을 쫓거나 위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가로움,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언뜻 소원하게만 보이는 두 짐승의 관계는 상생, 공생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닭은 소꼬리가 닿지 않는 배 쪽의 파리나 모기를 잡아먹어 가려움을 덜어줍니다. 대신 소가 밟은 거름더미에서 지렁이나 벌레를 힘들이지 않고 얻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악어와 악어새, 소라게와 말미잘, 동백나무와 동박새 같은 사이입니다.
그 소와 닭이 인간에 대한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닭) “인간들은 참 나빠, 자기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안달이니, 그게 어디 사람이야?”
(소) “그건 아무것도 아냐,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고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을 나무라는 인터넷 우화입니다.
장마철인데도 오라는 비는 안 오고 ‘배신의 폭풍’만이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대타협’ 파문에 이어 국회법 개정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배신 논쟁은 당·청 간의 관계를 극도의 갈등·냉각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국민은 우두망찰할 뿐입니다.
배신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단면 중의 하나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절규하며 쓰러진 카이사르나, 최측근 김재규의 총탄에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배신을 보아 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기르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는 속담도 있지만, 신뢰와 배신은 손바닥의 앞뒤처럼 변화무쌍한가 봅니다.
인간 세계와는 달리 동물 세계에는 배신·배반이 없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원수지간도 있지만 흉측한 짐승의 대명사인 늑대는 평생 수컷이 한 마리 암컷과 살고, 겉이 검다고 저어하는 까마귀도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효도를 합니다.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행태는 적자생존의 수단일망정 배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나 닭은 고기와 우유 가죽 뼈 뿔 발톱 털 피 계란 모두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똥까지 거름과 연료로 쓰입니다. 소·닭의 인간에 대한 불평은 곧 백성의 소리입니다. 그 고기와 우유 계란을 포식하는 정치인들이 소와 닭(백성)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엉덩이에 뿔 난 송아지나 닭대가리 수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혁신’ ‘개혁’ ‘선진화’ ‘새 정치’ 같은 간판만 덩그러니 걸어 놓고 위헌 소지가 뻔히 있는 법이나 만들고, 내려놓겠다던 특권은 움켜쥔 채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를 외쳐대고, 대통령이 입을 앙다물고 앙연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백성들은 불안하고 허탈해집니다. 입만 열면 ‘국민’ 운운하다 돌아서면 싸움질을 일삼으면 소도 웃을 것입니다
소 닭 보듯이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