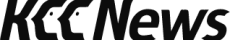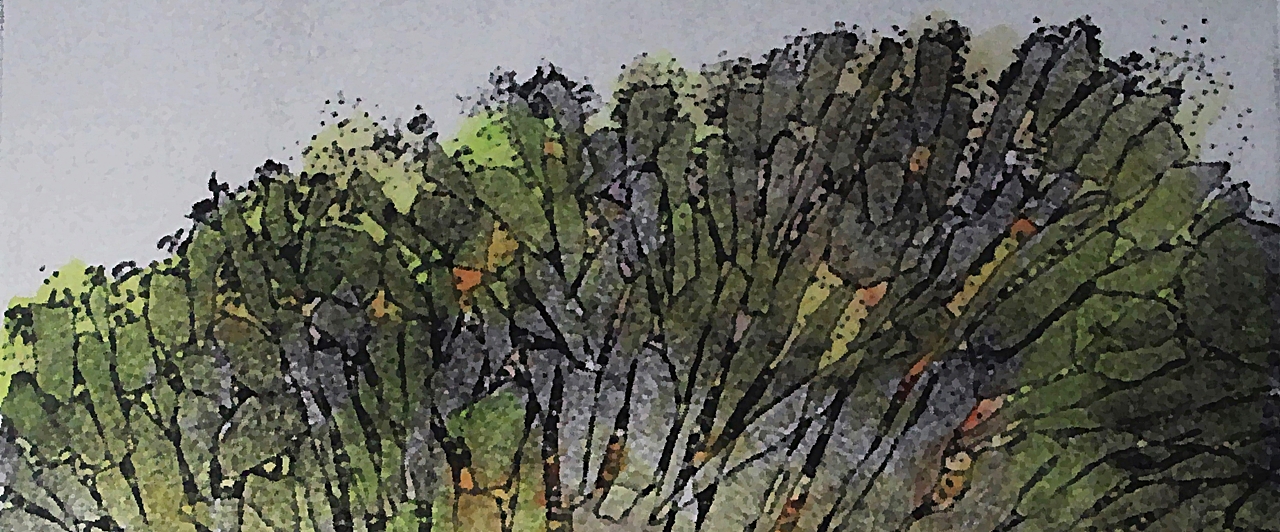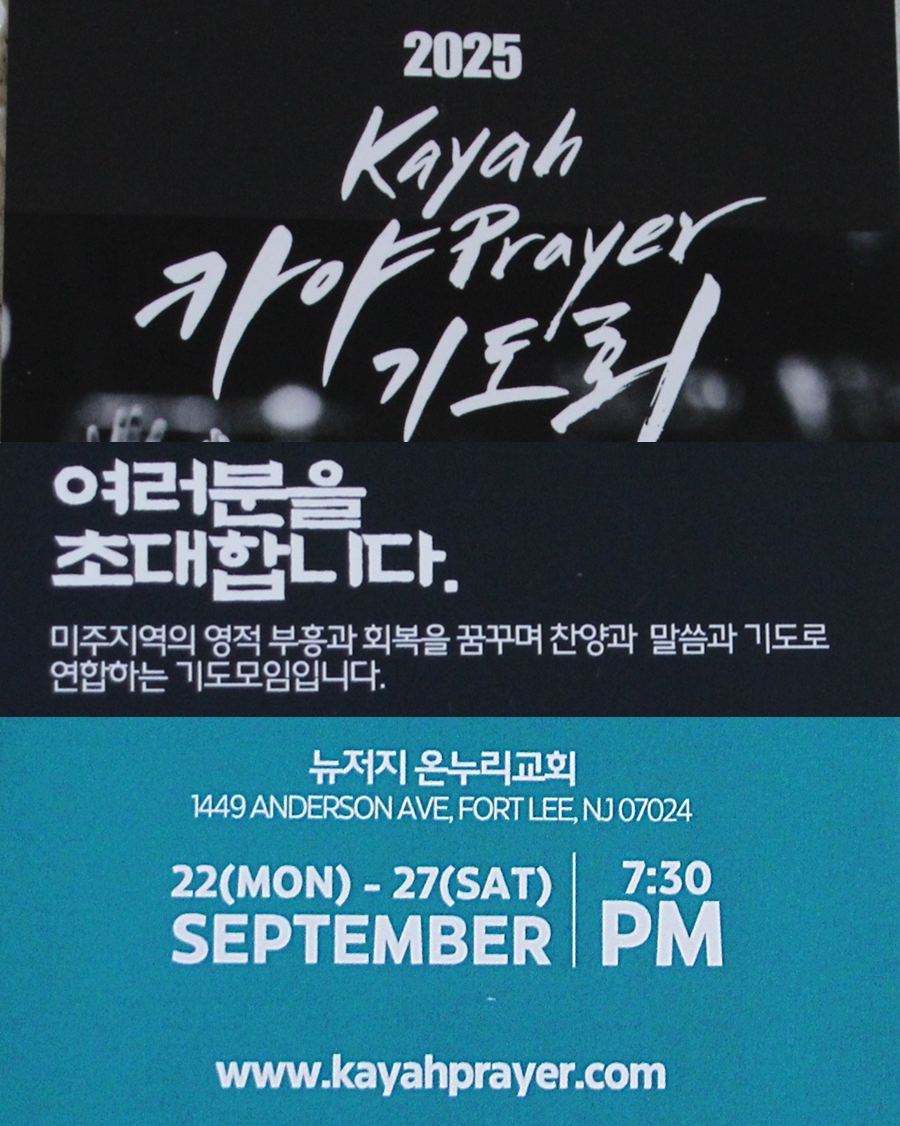“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과거 청년 윤동주,
2016년 오늘을 사는 청년에 묻는다
2016년 봄, 한국사회는 다시 시인 윤동주와 마주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가 개봉하면서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등장한 그의 시를 읽고, 시인의 삶을 이야기한다. 스물여덟 살, 미완의 청춘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70년하고도 1년이 더 흐른 시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란 타이틀만큼은 그대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도 누구 하나 머리 숙이지 않는 ‘염치를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에 평생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시인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도 누구 하나 머리 숙이지 않는 ‘염치를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에 평생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시인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동주,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동안 윤동주의 시는 극단적으로 읽혔다. 한쪽에선 저항의 상징이라며 항일 민족시인으로 추앙했고, 반대편에선 나약하지만 순결한 감성을 지닌 청년문사의 서정시로 일축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시인의 조카사위인 강석찬 목사는 무엇보다 “윤동주의 시어 하나하나가 신앙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 ‘십자가’ ‘자화상’ ‘팔복’과 같은 시뿐 아니라 첫 시 ‘초 한 대’ 등 수많은 시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고뇌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작 서시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래서 “20대 중반의 시인이 남기고 간 시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김응교 교수는 이런 윤동주의 시를 “자기의 존재를 투시하는 ‘성찰의 언어’이며, 실천을 자극하는 ‘다짐의 시’”라고 불렀다.
강 목사는 누구보다 청년들이 영화를 보길 희망했다. 과거의 청년이 오늘을 사는 청년에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가만히 묻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그런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신앙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를 쓰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시인의 모습에서 청년들이 영혼의 자극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다시 현실엔 없었던 영화 속 한 대목. 정지용 시인은 창씨개명을 고민하는 동주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시인의 나지막한 질문에 과연 누가 선뜻 답할 수 있을까.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그동안 윤동주의 시는 극단적으로 읽혔다. 한쪽에선 저항의 상징이라며 항일 민족시인으로 추앙했고, 반대편에선 나약하지만 순결한 감성을 지닌 청년문사의 서정시로 일축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시인의 조카사위인 강석찬 목사는 무엇보다 “윤동주의 시어 하나하나가 신앙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 ‘십자가’ ‘자화상’ ‘팔복’과 같은 시뿐 아니라 첫 시 ‘초 한 대’ 등 수많은 시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고뇌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작 서시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래서 “20대 중반의 시인이 남기고 간 시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김응교 교수는 이런 윤동주의 시를 “자기의 존재를 투시하는 ‘성찰의 언어’이며, 실천을 자극하는 ‘다짐의 시’”라고 불렀다.
강 목사는 누구보다 청년들이 영화를 보길 희망했다. 과거의 청년이 오늘을 사는 청년에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가만히 묻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그런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신앙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를 쓰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시인의 모습에서 청년들이 영혼의 자극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다시 현실엔 없었던 영화 속 한 대목. 정지용 시인은 창씨개명을 고민하는 동주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시인의 나지막한 질문에 과연 누가 선뜻 답할 수 있을까.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관련기사> 뉴스.>미주교계>성금요일에 만나는 윤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