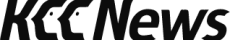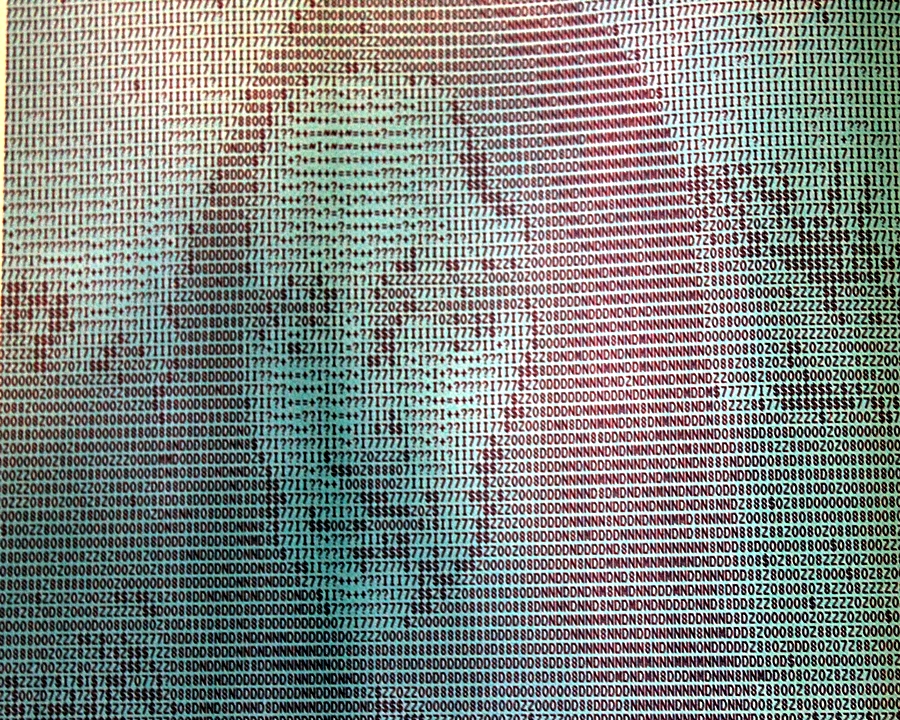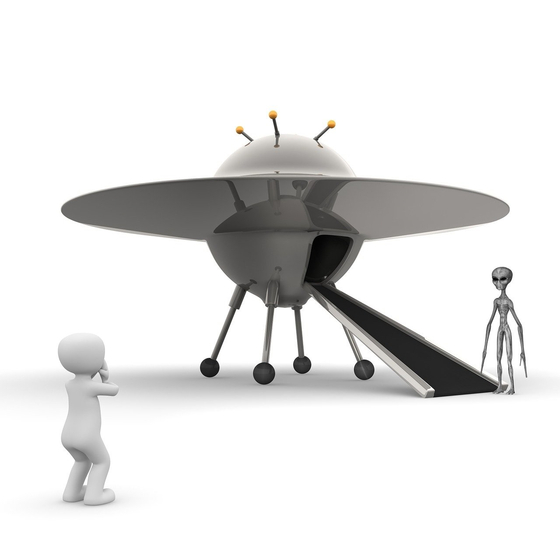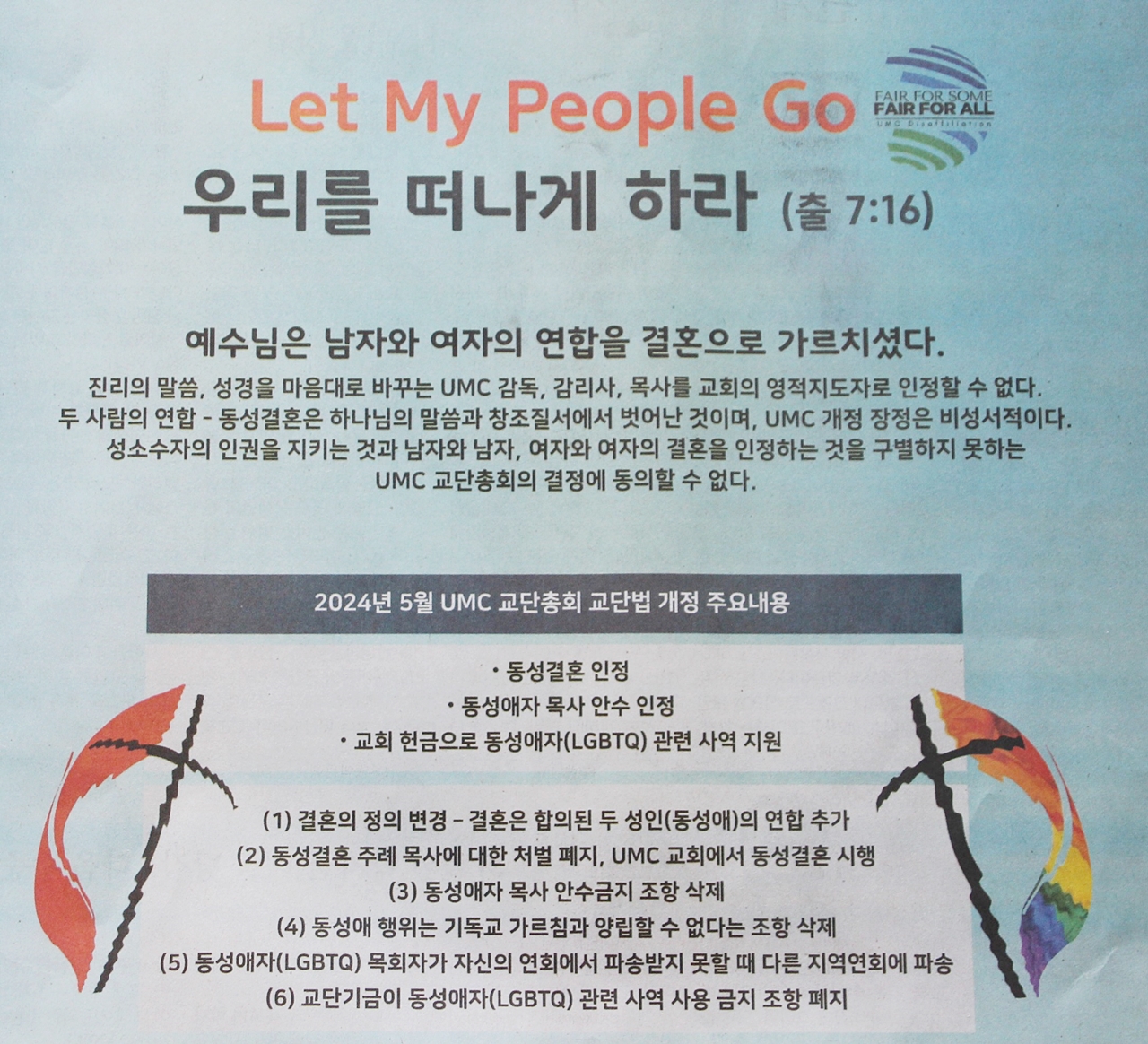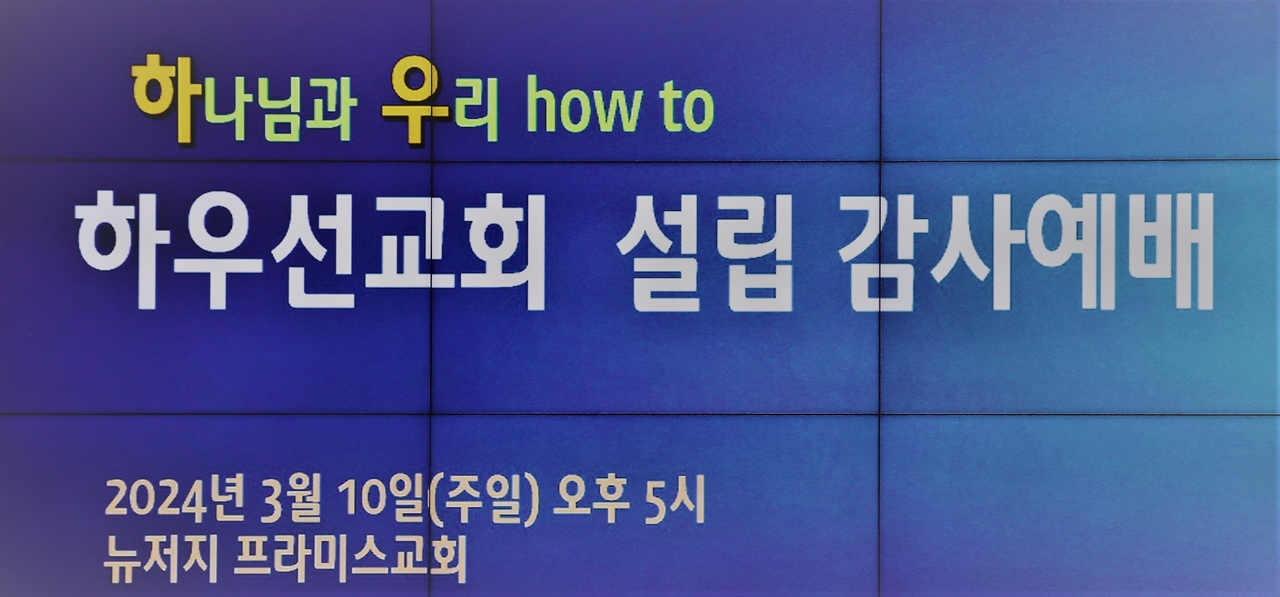정의구현사제단의 눈
예수의 조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타락한다고 봤습니다. 반(反)로마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갈릴리 지역은 더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세력 열심당(熱心黨)의 온상이었으니까요.
유대의 땅은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 500년 넘게 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은 줄기차게 메시아(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활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따랐습니다. 상당수가 예수에게 ‘반로마 저항운동의 지도자’가 돼 주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식과 묵상을 통해 ‘나(에고)와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먼저 허물고, 하늘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유대의 땅은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 500년 넘게 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은 줄기차게 메시아(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식민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활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따랐습니다. 상당수가 예수에게 ‘반로마 저항운동의 지도자’가 돼 주길 기대했습니다. 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금식과 묵상을 통해 ‘나(에고)와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먼저 허물고, 하늘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이 논란입니다. 야당에선 “본질은 국정원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에선 “흥분해서 말하다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받아칩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집니다.
‘현문 우답’은 첫 단추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단체명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제단이 구현하려는 건 ‘정의(正義)’입니다.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눈’으로 본 정의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눈’으로 본 정의입니다. 시국미사 발언에는 과연 누구의 눈으로 본 정의가 담겼을까요.
종교에는 예언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1970~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걸 뚫고 민주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침묵을 깨기 전 추기경은 광야에 홀로 섰을 겁니다. 거기서 ‘나의 눈’을 허물었던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민적이고 파격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일까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추기경의 눈’ ‘교황의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예수는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는 ‘나의 뜻’을 허물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번 발언을 찬찬히 짚어봅니다. 거기에는 너와 나를 나누는 전장(戰場)은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허무는 광야는 보이질 않습니다. 진영 논리의 강고한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게 에고인지, 신념인지, 고집인지, 아니면 이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예수’를 가린다는 겁니다. ‘사제의 눈’ 때문에 ‘예수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수품식 때 그들은 팔과 다리를 뻗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허물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낮은 세상이니까요. 예수에겐 창틀이 없습니다. 좌파의 창틀도, 우파의 창틀도 없습니다. 나를 허물 때 나의 창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창틀이 무너진 세상을 맨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예수의 눈’입니다. 세상이 목말라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눈입니다.
‘현문 우답’은 첫 단추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 단체명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제단이 구현하려는 건 ‘정의(正義)’입니다.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눈’으로 본 정의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눈’으로 본 정의입니다. 시국미사 발언에는 과연 누구의 눈으로 본 정의가 담겼을까요.
종교에는 예언자적 기능이 있습니다. 1970~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걸 뚫고 민주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침묵을 깨기 전 추기경은 광야에 홀로 섰을 겁니다. 거기서 ‘나의 눈’을 허물었던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민적이고 파격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일까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추기경의 눈’ ‘교황의 눈’이 아니라 ‘예수의 눈’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예수는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는 ‘나의 뜻’을 허물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번 발언을 찬찬히 짚어봅니다. 거기에는 너와 나를 나누는 전장(戰場)은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허무는 광야는 보이질 않습니다. 진영 논리의 강고한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게 에고인지, 신념인지, 고집인지, 아니면 이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예수’를 가린다는 겁니다. ‘사제의 눈’ 때문에 ‘예수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수품식 때 그들은 팔과 다리를 뻗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허물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낮은 세상이니까요. 예수에겐 창틀이 없습니다. 좌파의 창틀도, 우파의 창틀도 없습니다. 나를 허물 때 나의 창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창틀이 무너진 세상을 맨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예수의 눈’입니다. 세상이 목말라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눈입니다.
1970~80년대 정의구현사제단은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 많은 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뼈아프게 되물어야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무엇을 구현하고 있는가. 예수의 눈인가, 아니면 나의 눈인가.’ 예수의 제자 중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인 가롯 유다.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어쩌면 정의구현사제단이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중앙일보
백성호 문화스포츠 부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