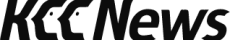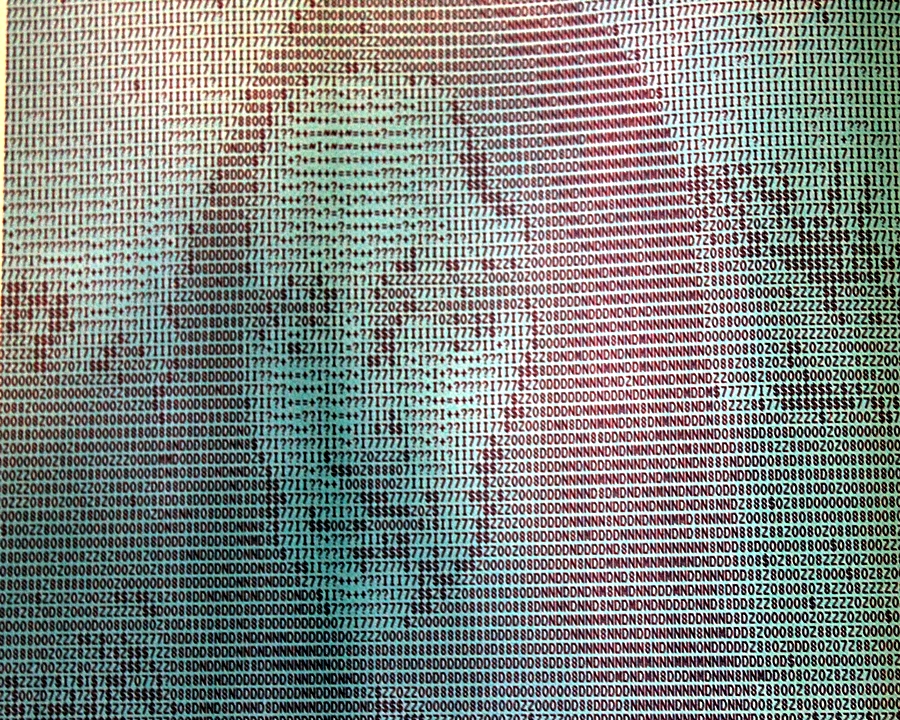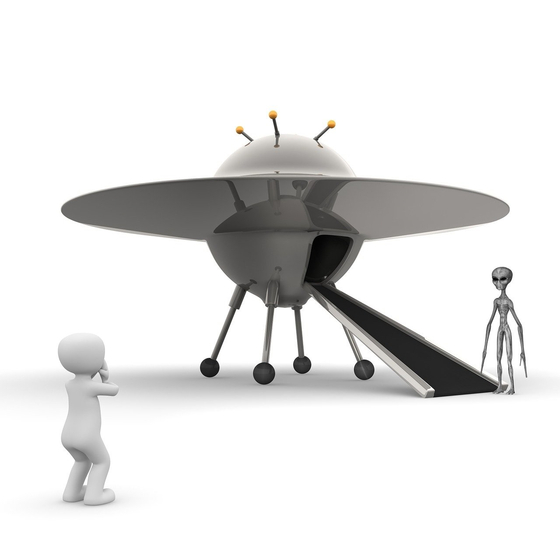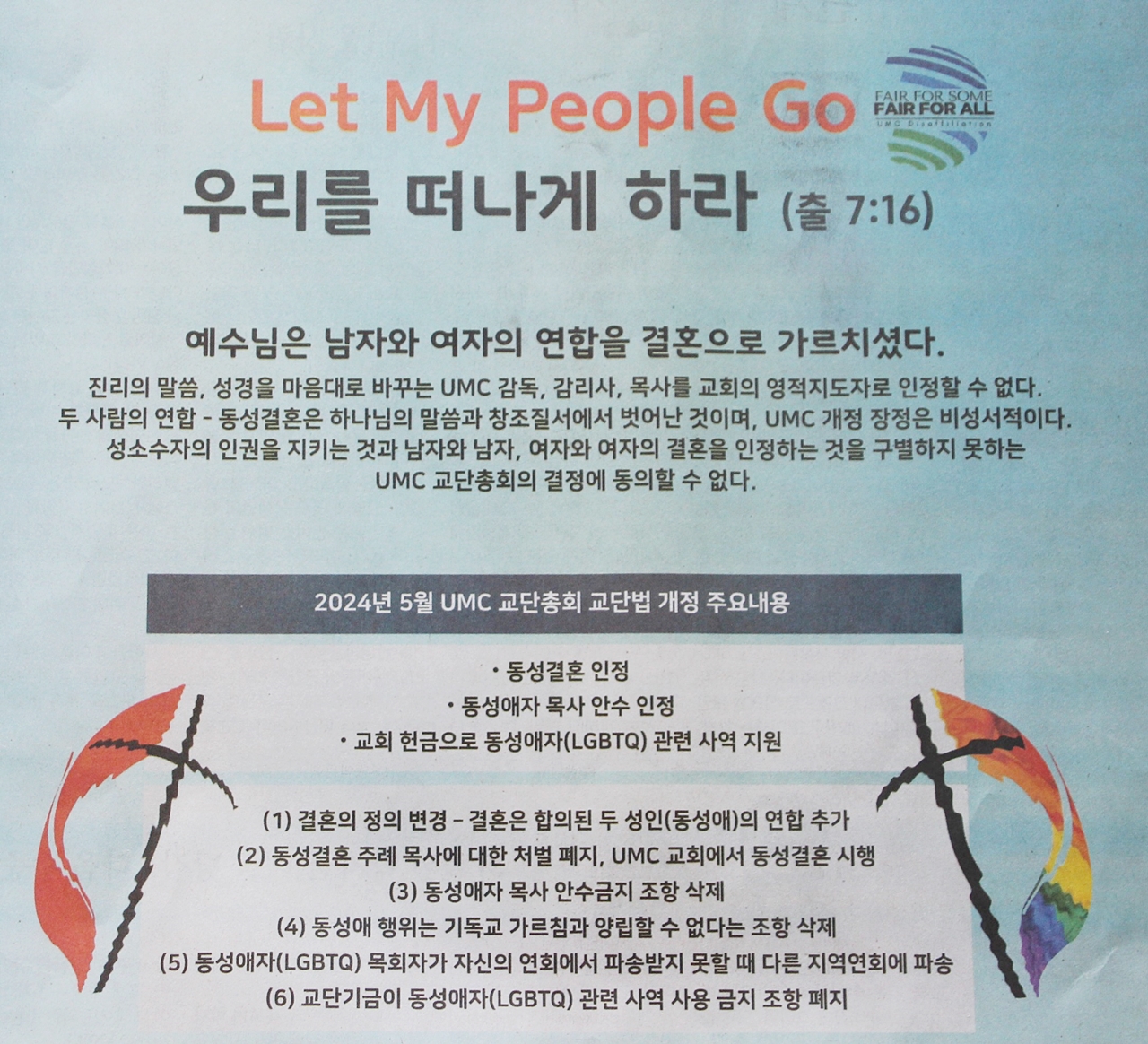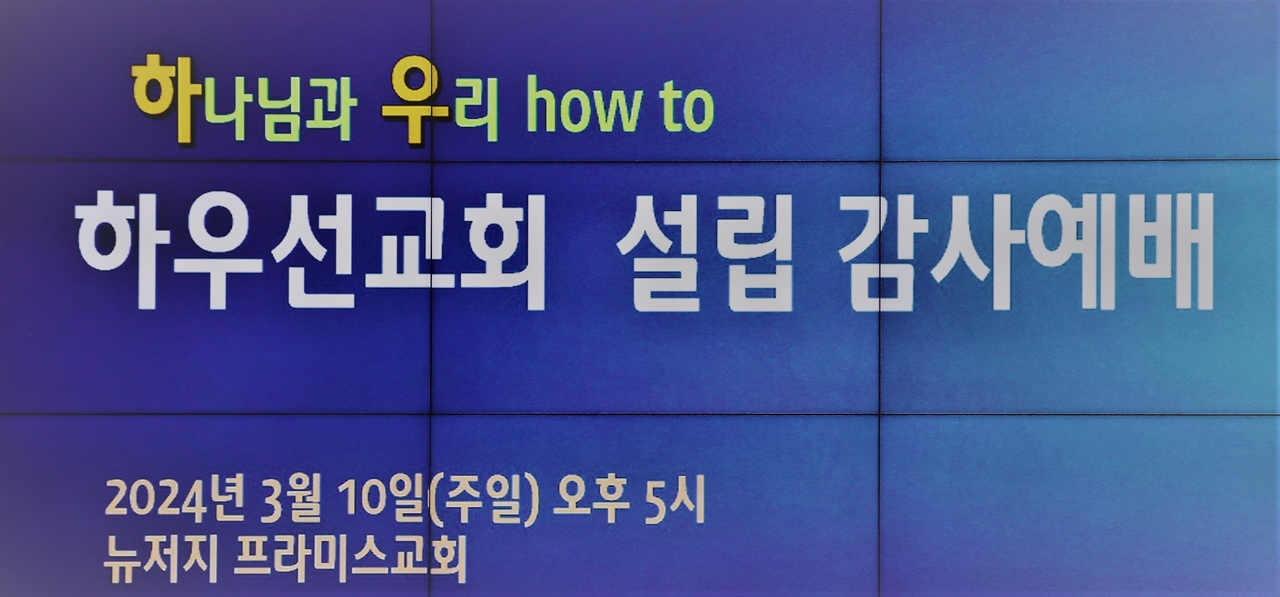예수는 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했을까

제자들은 음식을 먹었다. 예수는 빵을 들고 축복했다.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예수는 말했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26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누가복음 22장19절)
.”(누가복음 22장19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뒤 제자들에게 주며 말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복음 26장27~28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누가복음 22장20절)
(누가복음 22장20절)
예수는 말했다. “내가 떼어서 주는 이 빵이 나의 몸이요, 내가 주는 이 잔의 포도주가 나의 피다.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와 내가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무슨 뜻일까. 누룩을 넣지 않은 소박한 무교절 빵을 왜 예수는 ‘나의 몸’이라고 했을까. 또 잔에 담겨 있던 붉은 포도주를 왜 ‘나의 피’라고 했을까. 그걸 왜 “받아 마셔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예수의 정체’를 착각한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펼치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 그게 ‘예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존적 예수’‘역사적 예수’에만 방점을 찍기도 한다. 그건 동전의 한쪽 면만 보는 셈이다. 눈에 보이는 바깥 풍경만 보는 셈이다. 동전에는 양쪽 면이 있다. 둘을 모두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동전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정체’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 예수’‘실존적 예수’는 동전의 앞면이다.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 밑동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동전의 뒷면이 있다. 나무로 치면 땅 속에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 뿌리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서 있을 수 없다. 뿌리로 인해 몸통과 가지와 잎도 서 있다. 예수에게도 뿌리가 있다.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하느님)를 보는 것이다”고 했다. 왜 그럴까. 예수의 내면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아름드리 나무의 밑동을 파보면 ‘신의 속성’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적 예수’와 ‘복음적 예수’는 둘이 아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동전의 뒷면에 ‘복음적 예수’가 있다. 또 ‘복음적 예수’라는 동전의 앞면에 ‘역사적 예수’가 있다. 예수는 동전 자체다. 하나의 예수를 둘로 쪼개는 건 사람들이 ‘땅 밑의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솟아 있는 부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나무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동전의 뒷면이 있다. 나무로 치면 땅 속에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 뿌리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서 있을 수 없다. 뿌리로 인해 몸통과 가지와 잎도 서 있다. 예수에게도 뿌리가 있다. 그것까지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하느님)를 보는 것이다”고 했다. 왜 그럴까. 예수의 내면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아름드리 나무의 밑동을 파보면 ‘신의 속성’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적 예수’와 ‘복음적 예수’는 둘이 아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동전의 뒷면에 ‘복음적 예수’가 있다. 또 ‘복음적 예수’라는 동전의 앞면에 ‘역사적 예수’가 있다. 예수는 동전 자체다. 하나의 예수를 둘로 쪼개는 건 사람들이 ‘땅 밑의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 솟아 있는 부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나무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가 말한 ‘나의 몸’은 뭘까. 예수가 설한 ‘나의 피’는 뭘까. 그게 정말 예수가 손에 집어서 떼어준 한 조각의 빵일까. 아니면 잔에 담겨 있던 한 모금의 포도주일까. 성찬례나 미사에서 우리도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걸 먹으면 정말로 ‘예수의 살’‘예수의 피’를 먹게 되는 걸까. 그게 다일까. 그걸로 끝난 걸까.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방. 그곳을 거닐며 생각했다. 나는 첫 단추를 묵상했다. ‘예수는 왜 나의 몸, 나의 피를 받아먹으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게 뭘까. 그렇다. ‘우리의 몸, 우리의 피’를 바꾸기 위함이다. 예수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끔 말이다. 그렇게 ‘바뀜의 순간’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산다.”(갈라디아서 2장20절) 그건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나의 몸과 피로 체험한 이의 고백이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의 몸’‘예수의 피’가 뭘까. 그건 예수의 정체성이다. 예수의 주인공이다. 그게 뭘까. 다름 아닌 ‘신의 속성’이다. 그게 진정한 예수의 몸이자, 예수의 피다. 그래서 예수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니라 ‘신의 속성으로 맺은 새 계약’이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방. 그곳을 거닐며 생각했다. 나는 첫 단추를 묵상했다. ‘예수는 왜 나의 몸, 나의 피를 받아먹으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게 뭘까. 그렇다. ‘우리의 몸, 우리의 피’를 바꾸기 위함이다. 예수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끔 말이다. 그렇게 ‘바뀜의 순간’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산다.”(갈라디아서 2장20절) 그건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나의 몸과 피로 체험한 이의 고백이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의 몸’‘예수의 피’가 뭘까. 그건 예수의 정체성이다. 예수의 주인공이다. 그게 뭘까. 다름 아닌 ‘신의 속성’이다. 그게 진정한 예수의 몸이자, 예수의 피다. 그래서 예수는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아니라 ‘신의 속성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이 말은 물음이다. 1000년, 아니 2000년이 흘러서도 녹슬지 않고 날아와 꽂히는 화살 같은 물음이다. 그 화살은 지금도 우리를 쏘아본다. 너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인가. 너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렇게 묻는다. ‘나의 몸이 너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너의 피가 되었다. 그럼 너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묻는다.
네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네 안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가.”
중앙일보/ [백성호의 현문우답]
네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네 안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가.”
중앙일보/ [백성호의 현문우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