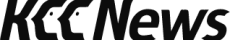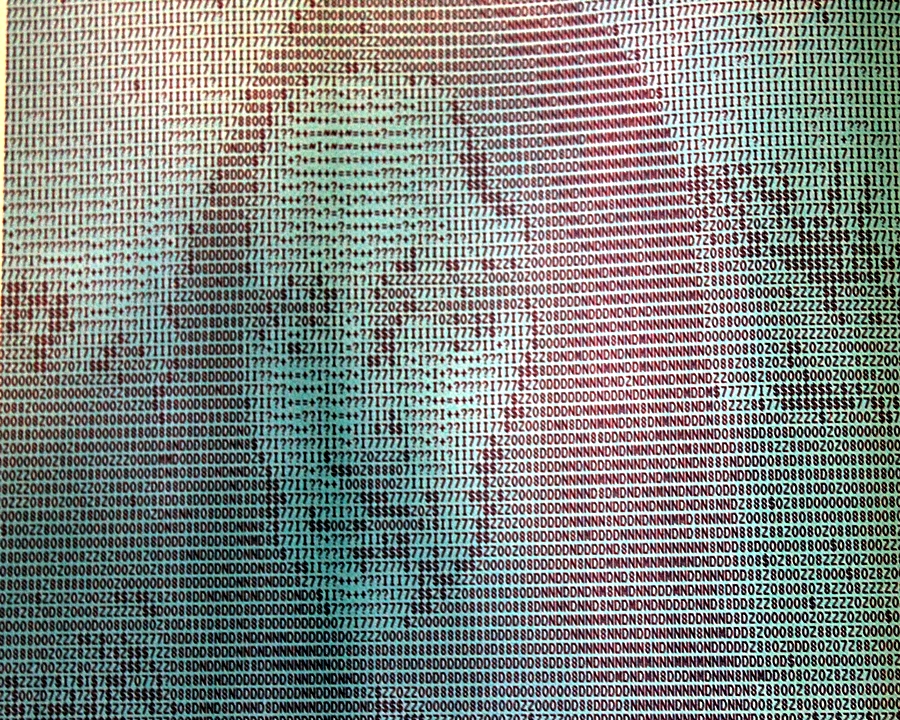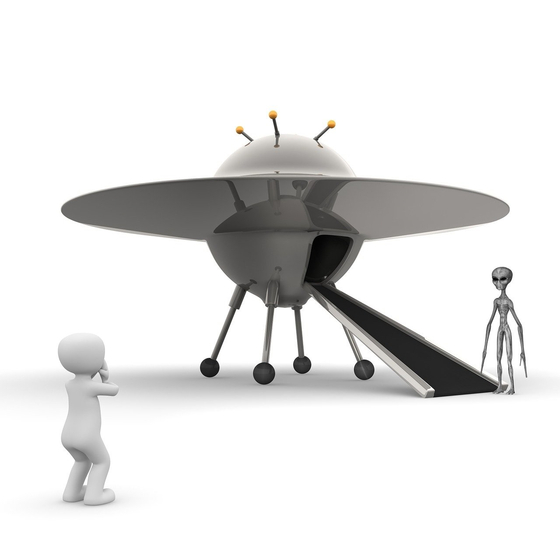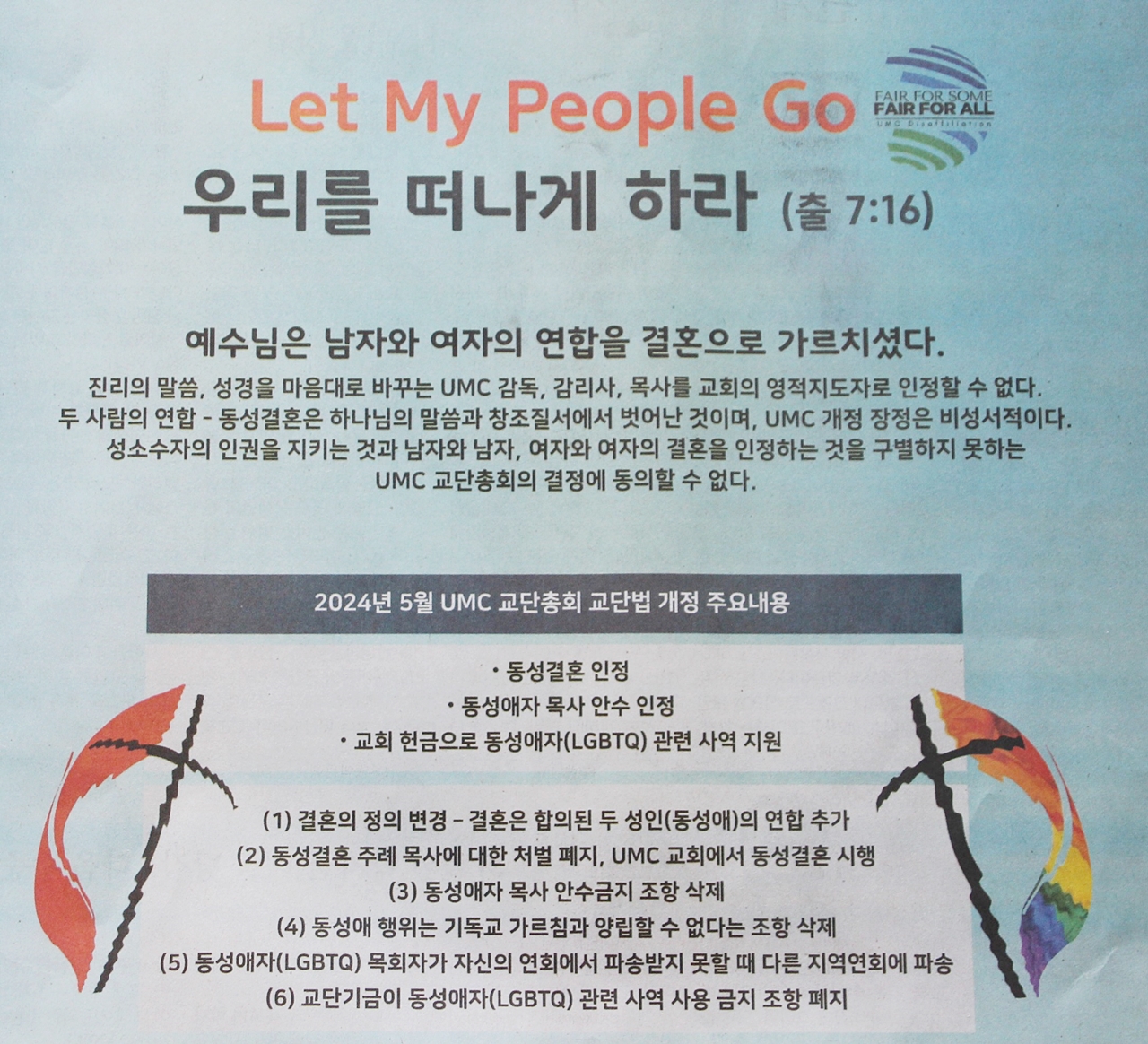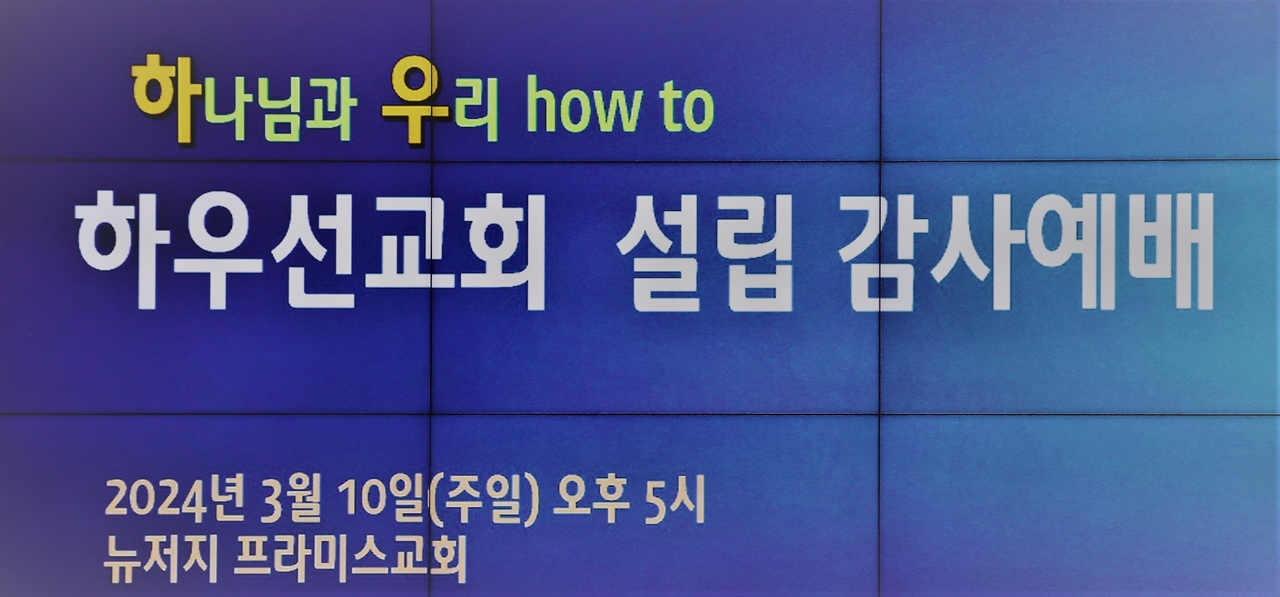함석헌 시인, "내 주님이라면 예수님밖에 더 있나요”
“만릿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고/맘 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마음이 외로울 때도/‘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인의 눈에는 시인으로, 교육자의 눈에는 교육자로, 사상가의 눈에는 사상가로, 언론인의 눈에는 언론인으로, 역사가의 눈에는 역사가로 보였던 함석헌(1901~1989)은 일평생 종교적 믿음과 사회적 실천의 일치를 추구한 인물이다.
‘시인 함석헌’으로 알려진 것은 1953년 시집 ‘수평선 너머’를 내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그는 시집의 머리말에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며 마흔다섯이 되도록 시라곤 써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쓴 시들은 ‘님 앞에다’ 바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칼질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
함석헌의 시문학은 ‘세상사람 함석헌’과 ‘크리스천 함석헌’ 사이에 놓인 시대적 암울함, 사회적 방황, 인간적 고뇌, 종교적 시련과 갈등, 하나님 영접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전업 문학인의 길을 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는 시를 쓰고 시집을 펴냈으며 주옥같은 산문에 방대한 저술을 이룩해냈다. 남들으로부터 문학인이란 인정을 받느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시인이었다. 그의 문필업 전체가 실은 시인의 언어와 문장으로 작성된 것이다.
시는 사상세계의 출구
함석헌이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신의주 학생의거’ 주범으로 몰려 옥중에 있을 때였다. “그때 눈물 사이사이에 나오는 생각을 간수병의 눈을 피해가며 부자유한 지필로 적자니 부득이 시가의 형식을 취하게 됐다. 이것이 난 후 처음 시란 것을 쓴 것이다.”(‘수평선 너머’ 머리말 중에서)

그는 50일 동안 신의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시 300여 편을 모아 ‘쉰 날'이라는 제목의 육필시집을 꾸몄는데, 월남하면서 대부분 유실됐다. 그의 시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는 온 존재를 껴안는 절대적 존재로서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호명(呼名)을 토한다.
이 시에서 ‘그 사람’이란 선지자이자 의인이고 인자(仁者), ‘그대'라는 2인칭은 그냥 속인(俗人)이고 평범한 생활인이다. 시의 화자(話者)인 1인칭은 3인칭의 인자와 2인칭의 속인을 대비해가며 ‘가졌는가'하고 묻는다. 질문 자체가 추궁이고 다짐이다.
함석헌은 자신의 시문학을 일구기는 했어도 그것이 문단의 문학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창작 시편들은 함석헌의 사상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그의 생애는 시인-종교인-사상가의 각 단계를 험난하게 전개시켰다. 신앙을 쌓고 사상의 터전을 마련했다.

평북 용천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함석헌은 1921년 오산학교에 진학한 뒤 남강 이승훈으로부터 투철한 민족주의 정신을, 다석 유영모로부터 기독교 사상과 노자 장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전수받았다. 일본 유학중 무교회운동의 창시자 우치무라 간조의 성서연구집회에 참석, 사상의 폭을 넓혔다.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했다.
6·25전쟁 당시 부산 피란길에서도 매주 성경공부모임을 인도할 정도였다. 1956년 이후 ‘사상계’에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등의 글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통렬히 비판해 투옥됐다. 1970년 ‘씨알의 소리’를 발간해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저서에 ‘뜻으로 본 한국역사’를 비롯해 신앙 시집 ‘수평선 너머’가 있다.
함석헌이 83년부터 89년 여생을 보낸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23길 자택을 찾았다. 이곳은 2015년 함석헌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해 개관,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그가 이곳에 거주할 당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위원장으로 서울 평화선언을 제창했고 80년 계엄당국에 의해 폐간됐던 ‘씨알의 소리’를 복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의 시 ‘그대는 웃으려나'가 방문객들을 제일 먼저 반긴다. 마당과 온실엔 그가 평소 가꾸던 보리수, 사철나무, 백동백나무, 선인장이 그대로 있다. 도서를 열람하고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게스트하우스, 갤러리가 지역주민과 방문자를 위해 열려있다.
기념관 입구엔 2006년 대전 현충원으로 그의 묘를 이장하기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간파리에 있던 묘비가 놓여있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의 한 구절이 적혀있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사나운 소리/살갗 찢는 아픈 소리 나와 어울려 부르는 너희 기도 품고/무한으로 갔다 내 다시 돌아오는 때면/그때는 이 나 소리도 없이/고요한 빛으로 오리라.”
1950년대의 절망적인 사회상에서 ‘한국의 모세’가 돼야 했던 그의 각오와 결의가 비장하게 느껴진다.
“예수님밖에 더 있나요”
기념관 1층은 유품이 전시된 전시실과 그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영상실, 안방을 재현한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방 탁자 위엔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책, 촘촘하게 메모가 돼 있는 노트와 안경, 찻잔세트, 문방사우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어떤 이는 함석헌을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 사상가라고 말한다. 함석헌의 종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기독교관은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한국기독교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함석헌은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사회정의나 이타주의에 입각한 삶을 산 기독교인이다. 함석헌이 1988년 미수(米壽)를 맞아 생일상을 받은 자리에서 ‘내 주님이라면 예수님밖에 더 있나요’라며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을 밝혔다.
그는 이미 1953년 ‘대선언’이란 시를 통해 ‘나는 더 이상 무교회에 머무를 수 없다. 우치무라 간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며 신앙적 변화를 추구했다. 61년 이후 한국내 퀘이커 모임에 참석하면서 침묵의 중요성 신앙의 공동체성 등을 새롭게 이해했다.
“예수의 주요 관심사는 그가 속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죽은 것이었다. 함석헌 역시 예수의 정신을 본받고 그 정신대로 살다 가고자 했다…굳이 함석헌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그는 퀘이커 교도이며 기독교 사상가이다.”
(김성수의 ‘함석헌 평전’ 중에서)
[함석헌처럼 생각하기]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주님 찾아 헤매는 이 벌판이 거칠어/내 벗은 발 상하여 자국마다 피오니/주여 어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넘어지는 이 나를 일으켜주옵소서/주님 찾아 헤매는 이 세상 사나워/내 약한 맘 부치어 숨결마다 꺼지니/주여 어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넘어지는 이 나를 일으켜주옵소서….”(‘주님 찾아’중에서)
함석헌은 일생을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다녔다고 고백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부가 됐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발길에 맞춰 다니게 됐다는 의미일 게다.

그는 시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고백했다. “몰랐네/뭐 모른지도 모른/내 가슴에 대드는 계심이었네…그득 찬 빛에 녹아버렸네/텅 비인 빈탕에 맘대로 노나니/거룩한 아버지와 하나 됨이었네”(‘하나님’ 중에서) “아침 들판 건너오는/구슬같이 맑은 말씀/‘네 샘을 맑혀라’/해 떨어지는 수심하는 천지에/초막마다 켜지는 등불/‘네 속의 빛을 밝혀라’.”(‘가을의 말씀’ 중에서)
또 그는 1952년 가까운 친지들이 함께한 성탄절 모임에서 장편 시 ‘흰 손’을 읽으며 자신의 신앙고백이라고 했다. ‘흰 손’은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후에 온실에서 넘어지다. 함석헌 부고 받다.” 함석헌이 그의 부음이 알려지기 딱 7개월 전 그가 책상머리에 남긴 일기의 한 토막이다. 그는 1989년 2월 4일 새벽, 그가 꿈꾸던 ‘영원한 나라’에 ‘생명의 열매’로 떨어졌다.
글·사진=이지현 선임기자/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