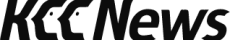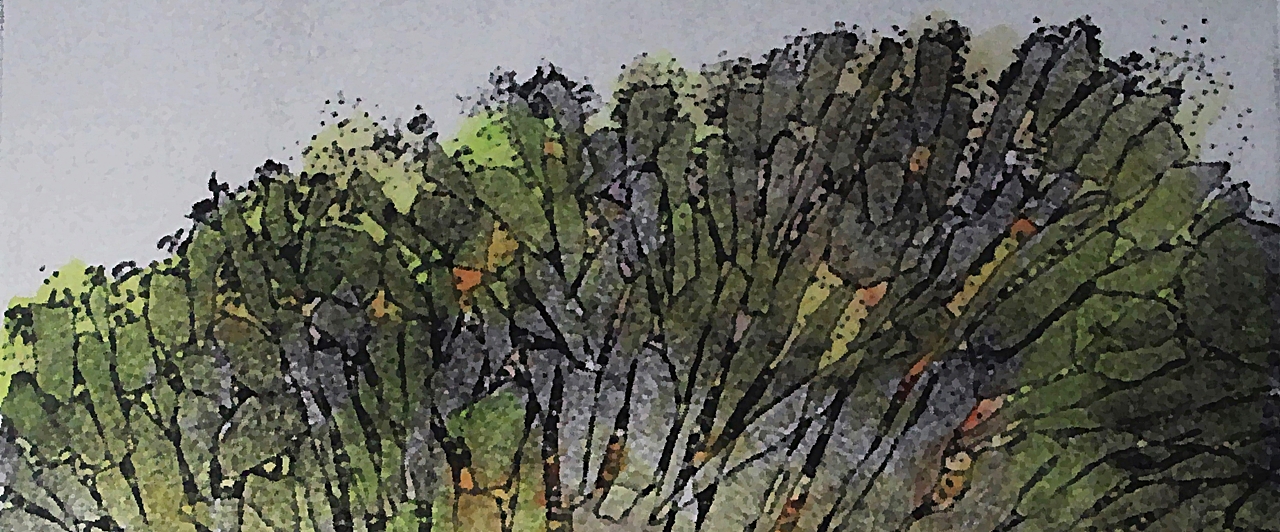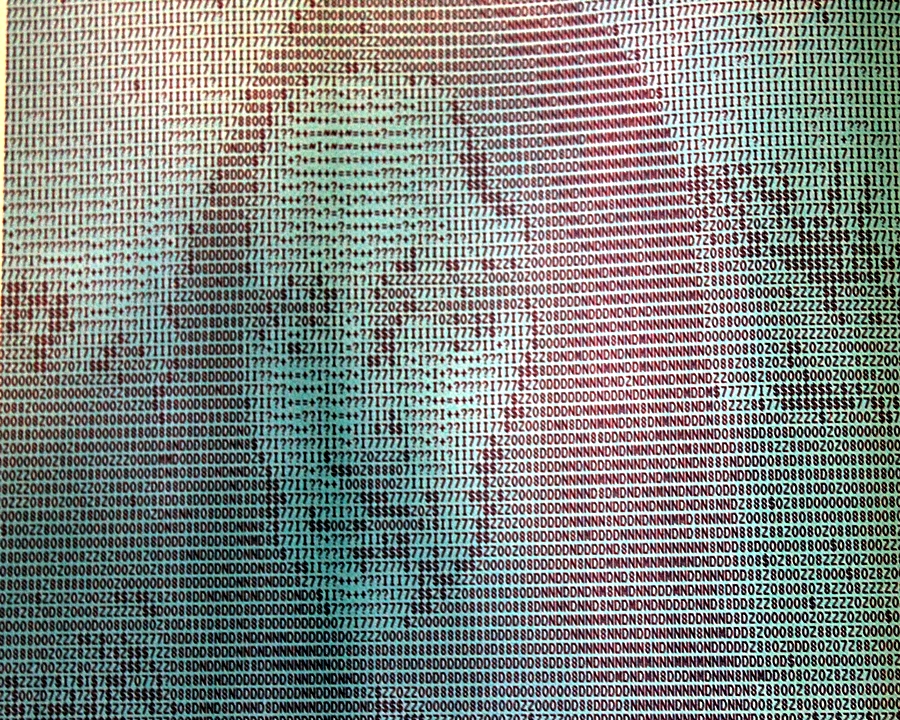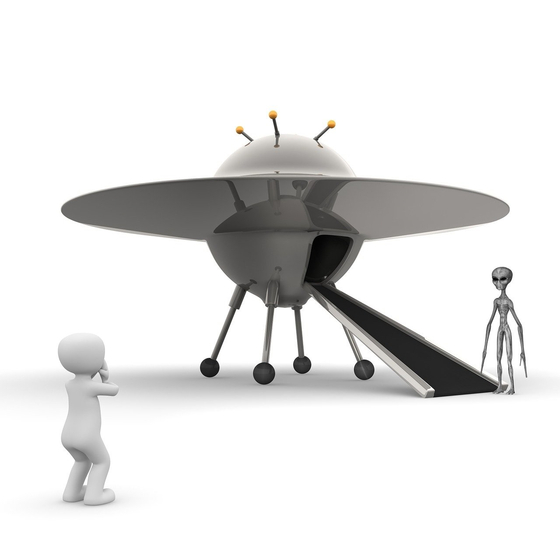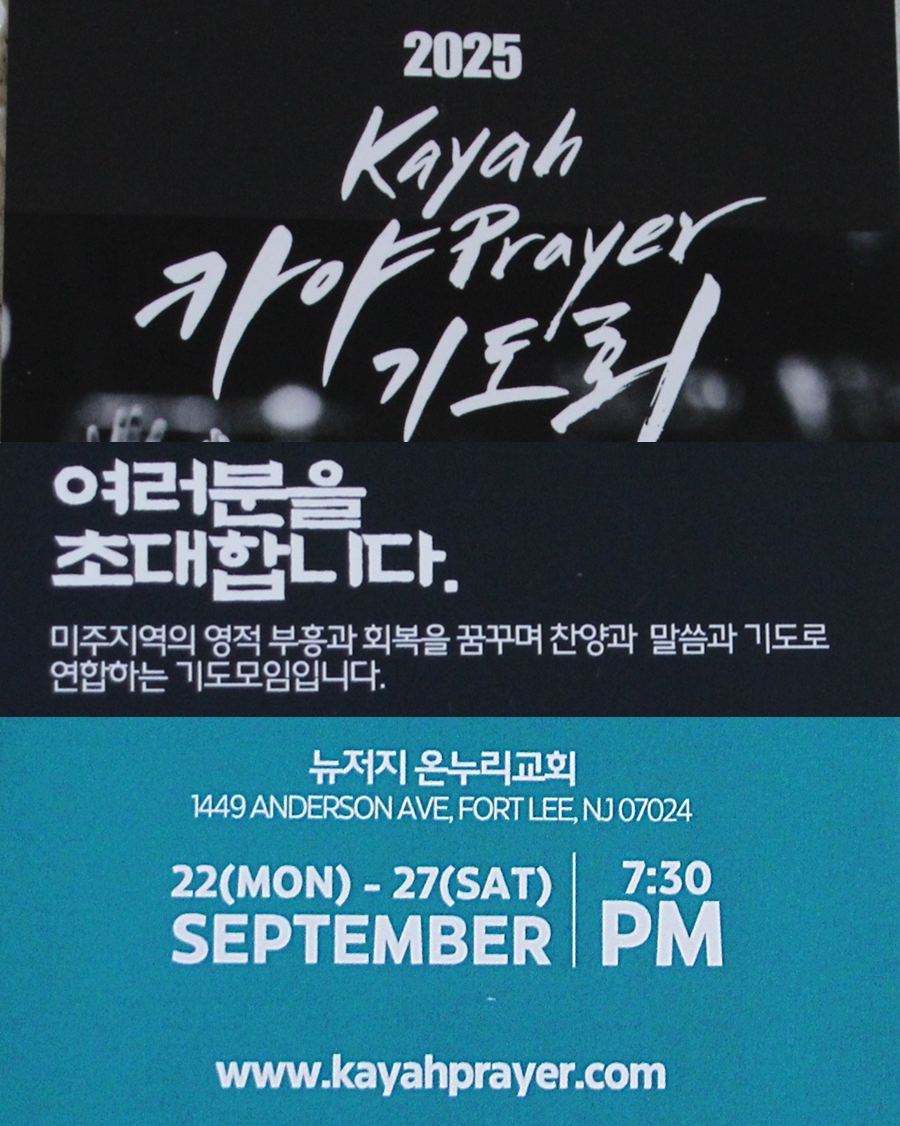“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보냈습니다. 그는 정약용 연구의 대가입니다. 글 제목이 ‘네 살의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슬펐는데’입니다.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가련한 아이…’로 시작하는 다산의 편지가 글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 ‘너희 아래로 무려 사내 네 명과 계집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한 때 죽어서 그 얼굴조차 기억 못 하겠고, 나머지 네 아이는 세 살 때여서 한참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고 썼습니다.
천리 길 귀양지에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산은 피를 토하는 슬픔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사고락의 이치를 조금은 깨달았다는 나의 애달픔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아이를 품속에서 꺼내어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야 했던 네 어머니의 슬픔이야 어찌 헤아리랴!’ 메일 말미에서 박 이사장은 이렇게 묻더군요. ‘질병으로 죽어간 어린 아들의 죽음에도 다산은 그렇게 슬퍼했거늘, 다 키운 자식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부모들의 심정,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눈을 감습니다. 다산의 아내가, 죽은 자식을 품에서 꺼낼 때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 자식을 구덩이에 눕힐 때의 마음이 또 어떠할까.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서, 가슴에서, 심장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겠지요. 그 강물이 겨울이 온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쉬이 멈출까요.
그 위로 세월호의 참사가 겹칩니다. 다 키운 자식들. 그들을 차가운 바다에서 꺼내고, 다시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부모들. 혹여 살아서 돌아올까.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울고, 분노하고, 가슴을 치는 일뿐이네요. ‘생사고락의 이치를 조금은 깨달았다는’ 다산도 그토록 아파했습니다. 그러니 갑남을녀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인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K학생의 아버지가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누구에게 쓴 글이냐고요? 신을 향해 쓴 글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회개하고 나온 것처럼/돌아와도 감사하고~/그리 아니하실지라도/OO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그건 편지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자식의 실종, 혹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가진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제야 아주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풀었더군요. 피를 토하는 슬픔을 손수 풀었더군요. 왜일까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렇게 아들을 풀어준 겁니다. 부모의 가슴에 꾹꾹 묻지 않고, 자유롭게 가라고. 정말이지, 그건 정말이지 큰 사랑이더군요. 자식을 향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만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매면 자식도 매이고, 내가 풀면 자식도 풀립니다. 아버지는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건 한없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의 눈물이 흐릅니다.
백성호/ 중앙일보 문화스포츠부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