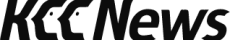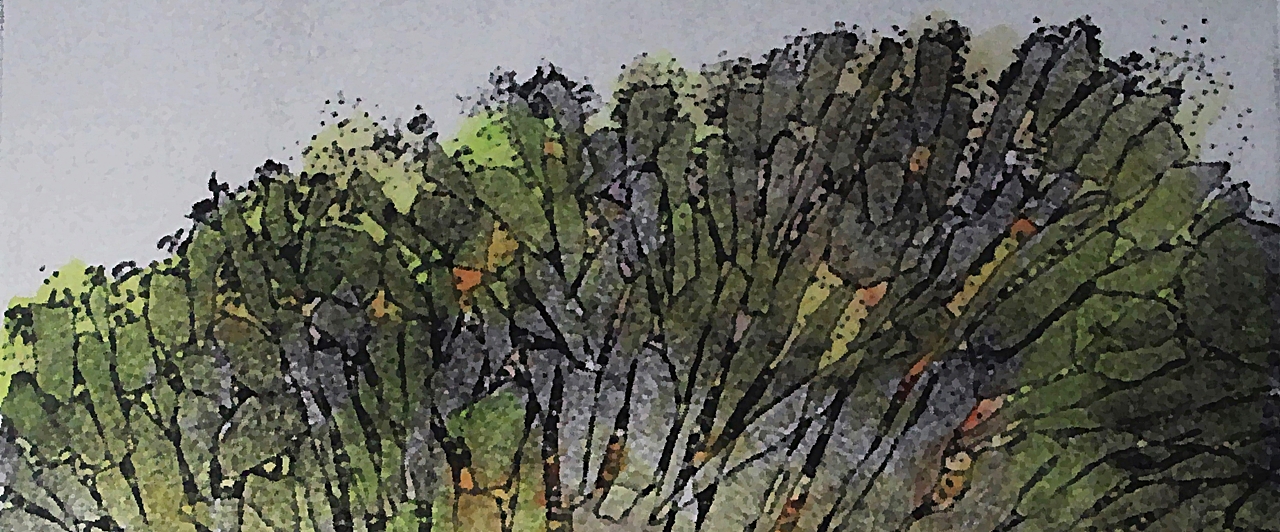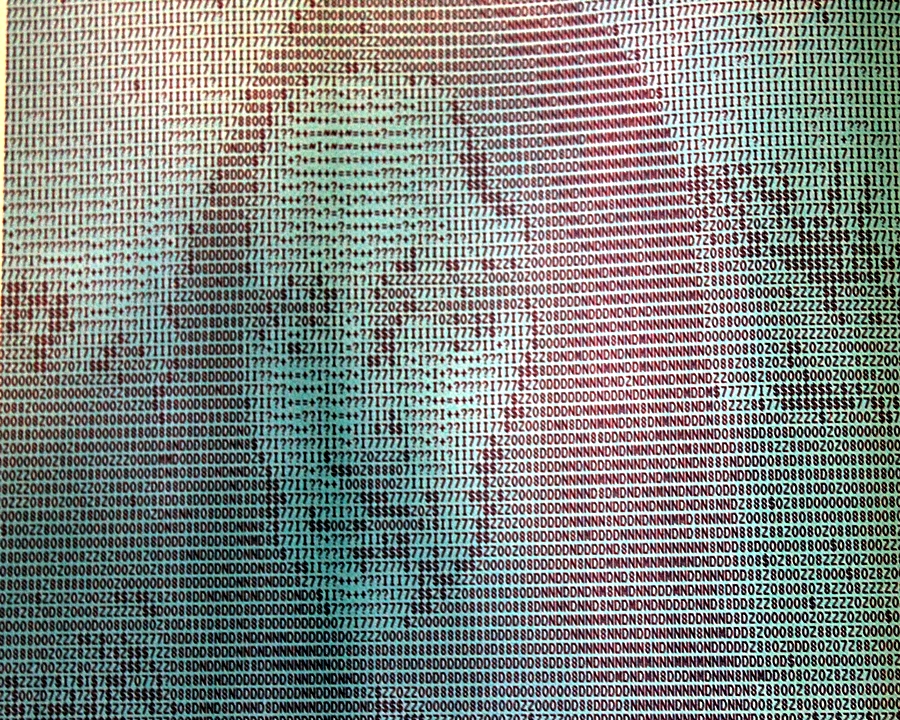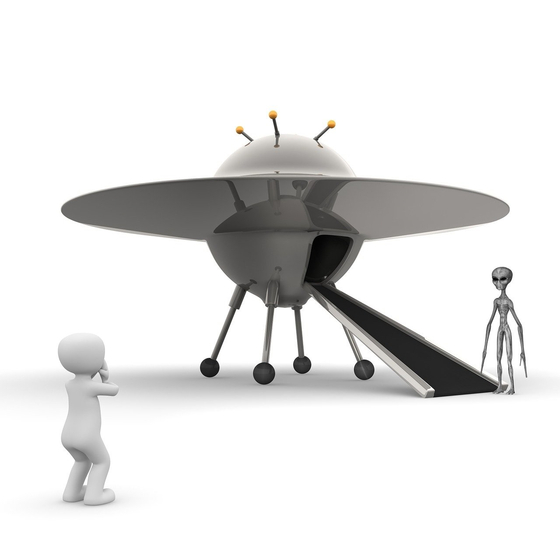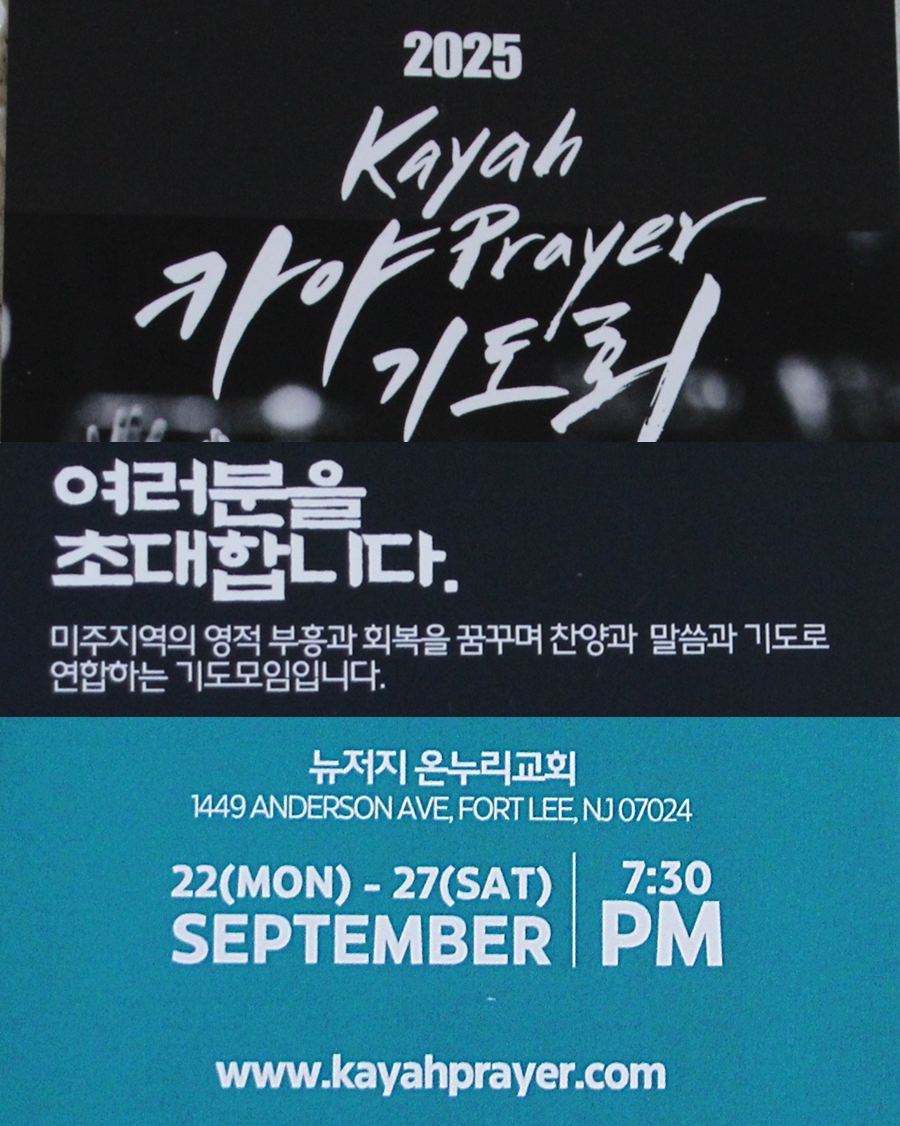<영화>
아뉴스 데이 (Les innocentes, Agnus Dei )
![[임세은의 씨네-레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7/0408/201704080000_23110923725581_1.jpg)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945년 전쟁 중 폴란드를 점령했던 소련군이 수녀원을 덮쳐 수녀들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이 70년이 지난 후 세상에 밝혀진다. ‘코코 샤넬’ ‘마담 보바리’ 등의 작품을 연출한 안느 퐁텐(Anne Fontaine)은 프랑스의 여성 감독이다. 영화는 프랑스 여의사 마틸드의 시점에서 바라본 수녀들의 모습을 그린다. 현대적이고 무신론자인 여의사가 보는 수녀들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의 모양 역시 제각각이다. 마틸드가 속한 의학과 ‘물질적 세계’는 수녀들이 속한 ‘영적인 세계’와 서로 독립적이지만 대비를 이루며 소통하는 두 세계로 묘사된다.
프랑스 의사의 노트에서 발견한 수녀의 이야기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 안느 퐁텐 감독은 “모성애와 믿음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라고 연출 배경을 밝히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에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그린 르네상스 회화에서 영감을 얻은 회화적 이미지 연출에도 공을 들였다.
아뉴스 데이(Agnus Dei)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영화에서 신의 어린 양은 전쟁의 참상을 겪는 이들이다. 프랑스어 제목처럼 자기 죄가 아닌 세상 죄를 짊어진 이는 ‘순결한 이들(Les innocentes)’인 수녀와 아이들이다. 성경이 이르는 과부와 고아처럼 그들은 강제로 부모가 됐다 다시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수녀들이자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이들의 만남을 은총으로 이어준다. 의사를 찾으러 마을에 간 수녀는 거리의 고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신앙의 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 깃든 신의 뜻을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 신앙은 ‘신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세계가 나와 무관할 수 없고 인간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자기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수녀는 강간이라는 참혹한 현실과 그로 인한 비극적 생명을 모성애로 역전시킨다. 밤새 산고를 치르며 끈질긴 내면의 질문과 씨름하던 수녀는 변화된 자신과 소명을 발견한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고 어머니로서 사는 일이다. 그렇게 역전된 수녀의 시선은 다시 외부로 향해 거리의 아이들도 품는다. 외면적 모성애를 발견한다.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며 세상을 탓하고 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난을 이해하고 그 힘으로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다. 수녀원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품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믿음의 길은 그토록 위대하고 또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마틸드의 선한 행위를 두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다만 신은 자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사람을 찾는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자가 진실로 순종하는 자다.
![[임세은의 씨네-레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7/0408/201704080000_23110923725581_2.jpg)
임세은 <영화평론가>